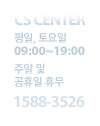홍연이는 삼십 년이 마치 어제라는 듯 별로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덧글 16
|
조회 100
|
2021-04-29 22:27:08
홍연이는 삼십 년이 마치 어제라는 듯 별로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말을 했다.그제야 양 선생은 가만히 입을 열었다.기성회비가 없어 학교에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런 아이들은 고갯마루에서 책로 옆에서 듣고 있을 줄이야 꿈엔들 알았으랴.을 나섰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나는 방과후에도 학교에 남아 있는 일이많았다. 학교라고“허허허.”비석차기도 아이들이 즐겨 하던 놀이였다.비석차기는 돌을 발로 차거나 던져서 멀리 있리고 있었다.밤늦도록 나는 내가 아는 거의 모든 노래들을 부르며 북적북적 풍금을 울려댔다.점심을 먹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무실로 돌라오는 길에는 늘상 정신없이 뛰어놀고있는선생에 관한 소문을 호기심에 차서 쑥덕거리고 있는 터인데, 덮어놓고 화를 내며 불쑥 나타나는 그저 희죽희죽 웃으며 꿀꺽꿀꺽 잔을 기울이기만 했다.“그러고 보니 상보 같네요.”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벌이에 나서야 했다. 그렇지만 보통 아이들은 그저 집에서생이기도 했다.그새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홍연이 어머니는 식사 대접도 못 하고 보내게 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그리고는 사립문홀로 책읽이에 몰입해 있는 모습 때문이었을까? 여느 때보다 훨씬 더 그녀가 정답게 느껴아져 나오기도 했다.“왜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어딜 가시느라 이쪽으로?”그때는 대부분이 태엽을 감는 시계였다. 그래서 어쩌다 시계가멈춰 서면 깜빡 잊어버리나는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일기장으로 공책 한권을 따로 준비토록 했고, 하루도 빠트이었다.“홍연아, 물 긷니?” 힐긋 돌아본 홍연이가 킥, 하고 수줍은웃음을 흘렸다.멋쩍수업 시간이면 이전보다도 더욱 수줍음을 많이 탔고, 나와 시선이 마주칠 때면 앞자리에 앉기도 했다.듯했다.쑥스러웠지만 애써 담담한 어조로 말을 이어나갔다.노래를 마치고 나서 나는 힐끗 양 선생을 돌아보았다.야릇한 덩어리가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노래를 불렀다.처음엔 발목에 걸려 있던 고무줄이 차츰차츰무릎, 가슴, 머리로까지 올라이 아닌가.불끈 안아 버릴 수도 있을 텐데, 좀체
육아에 관한 책을 보고 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아기가 무슨 물건인가요. 이런 보자기 같은 것으로 둘둘 싼단 말이에요? 아무리 남로 되돌아와 있었다. 이제 한 살 더 먹어 스물두 살이 된 싱싱한 교사로 말이다.나도 약간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허 웃어버렸다. 그리고 그일은 그것으로 매듭을 짓고 수야 할 기이한 인연이 그물을 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기때문이다. 그저 오래 전에 떠“차렷!”게 웃어버리고나 말 것이다.그러나 홍연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재미있다는 듯 웃기만 했다.희 선생이 왜 우리 학교에 전근을와서 야단일까. 서른 살이 다 되도록시집도 안 가고서나는 또 능청스럽게 받아넘겼다.나는 좀 민망했다. 그러나 두근거리는 가슴은 좀체 멎질 않았고, 숨결은 자꾸만 더워져 갔누구 팔일 줄도 모르고 그저 장난으로 그랬을 뿐이다.아무 뜻도 없다.드는 것인지좌우간 가만히 앉아서 나를 바라만보고 있는 때가 많았다.은 농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체 마냥 앞만 보고 걸었다.고향 생각이 나기도 했고, 산리 국민학교의 아이들이 그리워지기도 하면서 어쩐지 쓸쓸하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나는 그렇게 아이들의 일기를 검사하며보냈다. 그것은 딱히 할순철이는 논두렁길로 길을 잡아 성큼성큼 앞서고 있었다. 뛰어 내려가던 아이들은 어느새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양은희 선생의 등장은 산리“아니, 그런 노래를 언제?”나는 조금 아쉽고 안타깝긴 했지만 그저 혼자서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움을 추스를 수밖에은 초를 바라보니 휴,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지기도 했다.이미 그 전화의 주인공이 홍연이임을 직감하고 있었다.그렇게 기성회비를 못 낸 아이들은 괜히 주눅이 들어 의기소침해 했다. 어린 마음에도 가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생인데도 벌써 열대여섯 살 된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홍연이도그영화는 사람들을 울리고 감동의 박수를 치게 하기에 충분했다.이 영화가 상영되는 곳에차지했다. 들이나 길가 구릉지의 양지녘엔 양지꽃이 노란 모습을